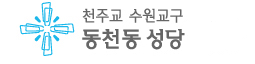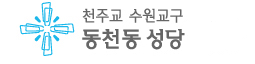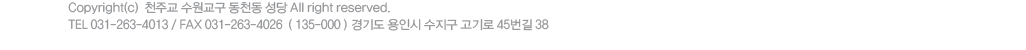‘축배의 노래’로 유명한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주세페 베르디(Giuseppe Verdi)는 이탈리아 오페라 사상 최대의 작곡가이다. 그가 1859년 로마 아폴로 극장에서 선보인 <가면무도회(假面舞蹈會 · A Masked Ball)>는 실화를 소재로 한 3막의 역사극이다.
역사극 가면무도회는 스톡홀름에서 일어난 스웨덴 왕 구스타프 3세의 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구스타프 3세는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가면무도회에서 절친한 친구이자 백작이 쏜 총에 맞아 숨진다. 베르디는 이 역사적이고도 엽기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왕의 죽음에 러브스토리를 가미하여 만든 이야기. 한발의 총성과 가면 뒤에 숨겨진 음모와 진실, 그리고 사랑을 그린 것이다.
가면은 머리 전체를 감싸거나 온몸을 가릴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한다. 가면은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랜 기원을 지니고 있다. 예술적, 종교적 표현물로 원시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져왔다. 연유야 어찌됐든 가면의 본질적 기능은 얼굴을 가리는 데 있다. 인간은 스스로가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면에 어떤 초월적 대상을 느끼고자 한다.
몸이 아파 병원을 찾거나 치과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 의사와 간호사들이 한결같이 흰 가운을 걸치고 얼굴에 마스크를 한 모습을 우리는 어릴 적부터 봐왔다. 또한 마스크는 제과점에서 과자나 빵을 굽는 제빵사들이나 음식점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들의 전유물이기도 했다.
<마스크 찾아 삼만리>
최근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미세먼지의 계절 못지않게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는 신문기사의 제목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환자의 침이나 콧물 같은 체액으로 전염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마음 놓고 재채기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남에 대한 배려로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공기 중에 떠도는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환자의 침 등 분비물을 막기 위해서다. 마스크 품귀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한 때 신문기자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의사 홍혜걸 박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올린 글이 설득력을 얻는다.
의학전문기자 홍혜걸 박사는 “마스크는 며칠씩 써도 된다”는 견해를 거듭 밝혔다. 홍 박사는 “매일 갈아 쓰는 것이 최산이나 일주일 정도는 괜찮다”며 “마스크 재사용이 괜찮다는 조사나 논문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의학적 개연성에 입각해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말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선 안 쓰는 것보다는 며칠 지난 것이라도 아껴서 쓰는 게 옳다는 것이다.
외출 후 집에 돌아오면 마스크를 벗어 걸어두고, 마스크를 만진 손을 깨끗이 씻으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홍 박사 역시 현재 5~6일째 같은 마스크를 쓰고 있다며 “바이러스는 딱딱한 표면에 오래 살고 마스크 같은 섬유 위에서는 몇 시간 못 버티니 급이 낮은 마스크를 며칠씩 써도 좋다”고 말했다.
마스크 뿐 아니라 식품이나 생필품까지도 사재기를 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나돈다. 질병은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뿐 아니라 삶의 여유를 잃어 민심까지 팍팍하게 만들 수 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니, 지하철의 북적임까지도 얼마나 큰 일상의 행복이었음을 깨닫게 해준다. 비비며 사는 삶이 더욱 그리워질 뿐이다.